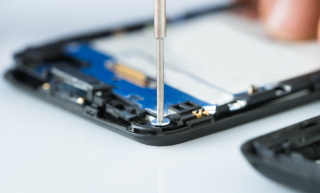비문학 읽기
《여우와 토종씨의 행방불명》
우리 곁에서 사라져간 동물, 식물 이야기
5월 22일은 ‘생물 종 다양성 보존의 날’이다. 전세계 여러 나라들이 생물 종 다양성 협약을 맺고, 지구에 있는 생물 종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 그렇다면 생물 종 다양성은 왜 중요하고, 우리는 왜 여러 생물 종들과 어울려 살아야 할까? 한반도에서는 어떤 생명체들이 사라졌고, 왜 멸종 위기를 맞게 되었을까?
토종 볍씨가 1500종이 넘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여우가 무덤가에서 굴을 파고 한반도 숲을 호랑이가 어슬렁거렸던 시절도 있었지. 토종 볍씨는 종묘회사의 ‘터미네이터 종자’가 대신하고, 상생과 공존의 숲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물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사람의 생존과 언제까지 무관할 수 있을까?

지난여름 큰비가 잦았다. 쏴아, 쏴아 차고 매서운 빗줄기가 무섭게 내리꽂혔다. 사람들은 비를 피해 종종거리며 집으로 회사로 학교로 오갔다. 산에도 들에도 도심 공원에도 똑같이 비가 내렸다. 나무도 숲도 덩달아 울었다. 키 큰 나무는 비바람에 떨었다. 그 높은 가지 위에 검은 지빠귀 가족이 둥지를 틀고 있다. 우산도 없이, 아비 지빠귀는 쉴 새 없이 먹이를 날라다 가족을 먹인다. 비에 젖은 무거운 깃털을 펼쳐 차가운 빗속을 오간다.
어린 새가 아닌, 어미 지빠귀가 냉큼 먹이를 받아먹는다. 어미가 배를 채운 뒤에야 아기 새 차례다. 어미 새가 너무 이기적이냐고? 아니다. 어미 새는 가슴에 어린 새들을 품고 있다. 세찬 비를 맞고 혹여 체온이 떨어질 새라 꼼짝도 않고 새들을 품는다. 어미가 죽으면 아기 새들도 살 도리가 없다. 새끼를 지키느라 여념이 없는 지빠귀 부부. 아비 새의 노고도 눈물겹다. 그나마 다행인 건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지 않은 것. 둥지를 잃은 이웃도 꽤 많았는데.
날카롭고 차가운 빗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새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다. 허나 그게 어디 새뿐이었으랴.
물론 우리는 ‘지구의 주인은 사람이야.’라고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이 지구라는 집의 주인 행세를 해온 것은,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
‘여는 글’을 읽다 그 발상에 놀란다.
“오늘 지구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인간이 멸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