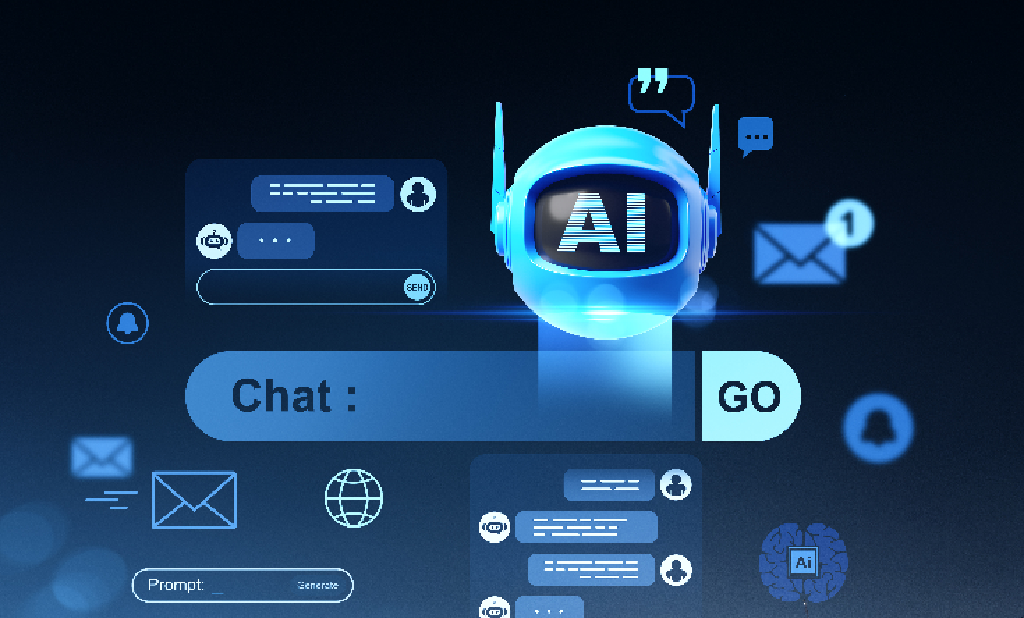전쌤의 경제교실
소비의 주체, 가계
우리나라가 현대화되며 농사를 짓는 생산의 주체였던 가계는 식료품을 사고, 여행을 가는 등 소비의 주체로 변신했어. 그런데 젊은 시절 가계에서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면 나중에 가족이 늙고,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일을 막고 사람들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가 생겼어.

경제 교과서에 가족이 아니라 ‘가계’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경제를 포함해서 사회 공부를 하다 보면 비슷한 말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이나 인민, 민중 같은 말들이 그렇지. 다 표준어이고 가리키는 대상은 같은데, 말을 할 때 어감이 달라서 구분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 이런 미묘한 어감 차이를 배우는 게 사회 공부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야. 핏줄이랑 혈관은 지칭하는 대상은 같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느낌이 다르지. 가령 의사들이 의학 용어로 쓸 때는 혈관이란 말이 어울리지만, 가족관계에서 나타나는 끈끈한 마음을 표현할 때는 같은 핏줄이라 끌린다는 식으로 말해. 이걸 ‘같은 혈관이라 끌린다’고 표현하면 얼마나 웃기겠어?
가계라는 말은 가정이나 가족과 비슷한 뜻인데, 주로 경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써. 경제를 행하는 주체인 가족 단위를 나타낼 때 가계라는 말을 사용해. 그래서 경제 교과서에서 가족이나 가정이란 말보다는 가계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 거야.
소비의 주체가 된 가계
경제 교과서에서는 가계를 소비의 주체라고 해. 생산의 주체인 기업과는 대비되지? 인류 역사에서 생산의 주체와 소비의 주체가 분리된 건 얼마 되지 않은 일이야. 가령 조선 시대에만 해도 가부장제도 아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도맡았어. 오늘날로 치면 회사의 사장과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함께 한 거야. 농사를 지을 때 모내기를 언제, 어떻게 할지 같은 생산에 대한 결정은 모두 가족 단위로 이뤄졌어. 여기에 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제주제사의 주인 역할도 맡아서 했으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나 스님 역할도 같이 한 셈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