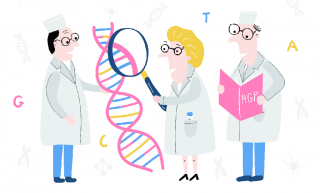'인간게놈프로젝트'
마침내 생명 설계도를 손에 넣은 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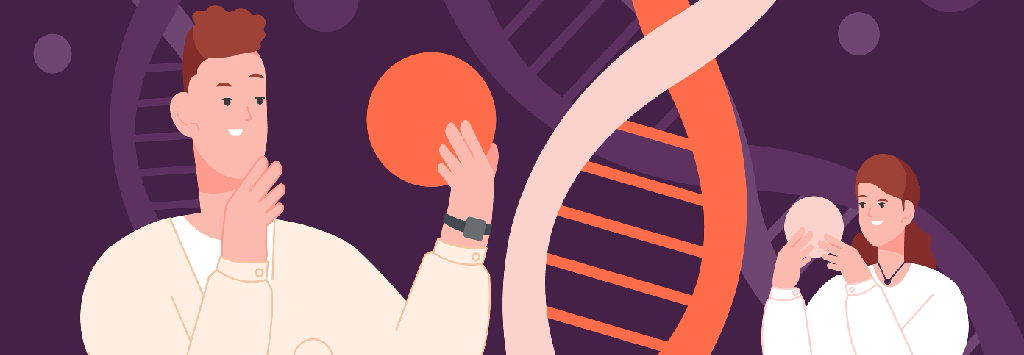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말이 있다. 서양에서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성경 구절을 자주 인용한다.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부모의 형질이 자식에게 전해진다’는 유전의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거기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작동하는지는 잘 몰랐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이유를 혈액을 통해 어떤 물질이 전달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나서야 DNA의 존재가 밝혀졌다(1869년). 그조차도 당장 유전물질로 인정받은 건 아니었다. 고작 세 가지 물질(당, 인산, 염기)로만 이루어진 DNA의 구조가 생명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기엔 너무 단순해 보였기 때문이다. 부모의 DNA가 자기의 염기서열을 그대로 복제해 자식의 DNA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부모의 유전정보가 자식에게 전해져서 부모 닮은 자식이 나온다는 것이 밝혀지기까지는 긴 세월이 필요했다.
20세기 들어 관련 연구가 거듭되면서 DNA 분자가 바로 유전물질이라는 사실이 확실시되자 과학자들의 이목이 쏠렸다. 그러다 생명과학계의 일대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이 터졌다.
1953년 4월 25일, 과학저널 <네이처>에 DNA 이중나선의 구조도가 실린 것이다. 본문은 딱 1페이지 분량이었지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다. 특히 DNA 모형, 즉 두 겹으로 꼬인 긴 나선 사이의 가로 막대기를 건드려 보는 과학자 제임스 왓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사진은 사람들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꿔놓았다. DNA 구조를 인간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있겠다는, 즉 유전자를 편집할 수도 있겠다는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진 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