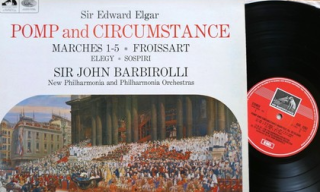차이콥스키, <꽃의 왈츠>
만개하는 꽃처럼 겹겹이 쌓이는 아름다운 선율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클래식 음악이 있는데, 차이콥스키의 발레 음악 ‘꽃의 왈츠’가 그러하다. 차이콥스키가 이 명곡을 작곡할 당시엔 발레 음악이 무시당했지만,오늘날에는 특유의 낭만성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귓가에서부터 연말 분위기를 퍼뜨리는
12개의 반음이 모여 피아노 건반의 한 옥타브가 된다. 오전 12시간과 오후 12시간이 지나 24시간의 하루가 된다. 12개의 달(月)이 모여 우리의 일 년이 된다. 이처럼 숫자 12는 우리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숫자다. 예로부터 12는 완전한, 그리고 신성한 숫자로 여겨졌고, 오늘날까지 서구 문화에서는 이 숫자에 1을 더한 13을 불길한 숫자로 여기곤 한다.
어느덧 2022년도의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다. 반짝이는 조명과 북적이는 거리, 하얀 눈, 따듯한 실내 등 연말 특유의 분위기는 언제나 우리를 설레게 만든다. 이런 분위기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 주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연말 분위기는 역시 귀에서부터 시작된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흥겨운 캐럴, 자선냄비 앞 구세군의 핸드벨 소리 등 12월에만 들을 수 있는 음악과 소리는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이 왔음을 실감케 해준다.
클래식에도 매년 연말이면 어김없이 무대에 오르는 작품들이 있다.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과 헨델의 오라토리오[1] <메시아(Messiah)>, 그리고 차이콥스키의 발레곡 <호두까기 인형>이 그것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호두까기 인형>이다. 발레 작품이니 만큼 눈과 귀가 모두 즐겁다는 점, 크리스마스가 배경이라는 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동화라는 점 등 <호두까기 인형>이 연말 단골 레퍼토리가 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작곡된 지 1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차이콥스키 특유의 선율적 아름다움, 그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는 점이다.
<호두까기 인형>의 초연은 왜 실패했을까?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의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6개의 교향곡을 비롯해 가곡·협주곡·실내악·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했지만, 특히 ‘발레 음악’ 하면 그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 장르에선 독보적인 작곡가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차이콥스키 이전의 발레 음악은 그저 단순한 반주 역할에 그치는, 소위 ‘뒤떨어지는’ 작곡가들의 장르였다. 작곡가 자신의 음악성을 뽐내기는커녕 무대 위 발레를 돋보이게 하는 데 집중해야만 하는 일종의 ‘배경음악’이었던 셈이다.
차이콥스키는 러시아의 낭만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다. 6개의 교향곡을 비롯해 가곡·협주곡·실내악·관현악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했지만, 특히 ‘발레 음악’ 하면 그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이 장르에선 독보적인 작곡가로 꼽힌다. 그도 그럴 것이 차이콥스키 이전의 발레 음악은 그저 단순한 반주 역할에 그치는, 소위 ‘뒤떨어지는’ 작곡가들의 장르였다. 작곡가 자신의 음악성을 뽐내기는커녕 무대 위 발레를 돋보이게 하는 데 집중해야만 하는 일종의 ‘배경음악’이었던 셈이다.